커뮤니티
[SV Hub 칼럼] 사회적 가치에서 착함 걷어내기

CSES_SVHub
2022.06.13 10:05:20 | 1,014 읽음

글 : 사회적가치연구원 펠로우 김지민
Intro : 착하다고 하지 마세요
착해야 산다(survive). 이른바 사회적 가치 광풍이 불면서, 친환경 및 사회공헌 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작년 한 해 기업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ESG도 결국 ‘어떻게 착한 기업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였다. 이러한 기업의 움직임의 기저에는 ‘착해야 사는(buy)’ 소비자가 있다. 그리고 그 소비자는 대개 청년의 얼굴로 그려져 왔다. 청년들, 소위 MZ세대는 비용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친환경 소비를 한다는 인식이 마케팅 업계에서 정설처럼 받아 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요즘 청년들이 사회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건지, 알고 보니 기성세대의 희망 사항인 건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미래 세대의 사회적 가치를 탐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에, 사회적 가치 창출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공동체 의식을 탐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러 사회적 가치 의제 중에서도 환경 섹터로 주제를 좁혔고, 그렇게 내 연말은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과의 인터뷰로 채워졌다.
유독 기억에 남는 한 마디가 있다.
어제도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왔다는 한 청년 환경운동가는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 착하다고 하지 마세요.”
어른들로부터 너무 많은 칭찬을 듣고 와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했다. 처음에는 꽤 당황스럽고 억울했다. 인터뷰를 시작도 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에 단단히 꽂혔고 결국 이 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진절머리가 난다는 그 표정이 자꾸만 생각나서도 있지만, 내가 어렴풋이 느껴오던 것을 정확히 설명하는 문장이어서 그랬다. 언제부터인가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을 착한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과,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개인을 착한 개인으로 부르는 것이 가져올 파장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은 바로 그 후자의 현상에 관한 이야기다. 지금부터 사회적 가치와 착함이라는 수식어의 연결을 좀 느슨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려고 한다. 특히 그게 개인이라면, 게다가 그게 청년이라면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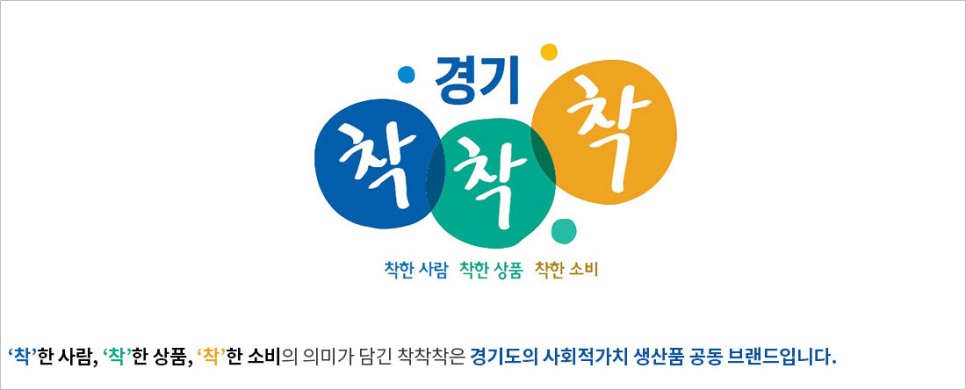
착함이 말해주지 않는 것
모든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우선 이 착함이 무엇인지부터 규명해야 할 것 같다. 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착하다’를 사전에 검색하면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라는 사전적 정의가 나온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주체에게 주어지는 착하다는 찬사는 단순히 ‘마음이 곱고 상냥하구나’의 의미만은 아닐 것이다. 착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만 생각하지 않는 행위자에 대한 칭찬이다. 나를 넘어 타인을 생각한다면 이타주의,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공동체주의가 된다. 이러한 맥락을 미루어 볼 때, 착하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사회적 가치의 실천에 있어 ‘나’가 차지하는 역할을 좀 봐달라는 것이다.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착하지 않아요” 같은 양심고백 차원의 이야기 그 이상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을 착한 개인으로 환원했을 때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환경 문제를 예로 들면 쉽다.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채식을 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개인을 그저 착하게만 바라봐선 곤란하다. 물론 혹자는 살 곳을 잃은 북극곰을 걱정하는 따뜻하고 상냥한 마음씨를 가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가치에 참여한다. 어떤 이들은 ‘나를 위해’, ‘내가 살아갈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내 일상에 가해지는 위협을 자각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사회 참여 동인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인터뷰 참여자가 환경 및 기후 문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 위험과 경각심을 꼽았다.
“과장이 아니고 30년 뒤가 저는 정말 무서워요. 기후변화가 눈에 너무 보이니까.
저희 세대 현실이고 미래니까 바꾸는 거예요. 채식하고 쓰레기 줄이는 건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들의 환경적 실천에는 결국 그것이 나의 일상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새로운 담론은 아니다. 사회적 ‘책임’에서 사회적 ‘가치’로의 전환 역시 이러한 지점을 화두로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본업과 별개로 하는 사회 공헌이었다면, 사회적 가치는 본업과 연계해서 창출되는 것이다. 이를 개인에 적용하면, 사회적 가치는 나의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의 이익과 함께 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모든 행동이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더욱 적극적으로 경유하게 한다. 착함이 가리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한편, 착한 개인에 대한 믿음은 사회적 가치의 추구에 대한 참여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 위험하다. 사회공헌이나 사회혁신을 마치 희생적이고 대단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인 양 여기게 하기 때문이다. 영웅화와 타자화는 한 끗 차이인데, 활발해야 할 사회적 가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자칫 ‘요즘 청년들 참 기특하네’ 정도로 일단락될 수 있다는 뜻이다. 청년 환경운동가가 분노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인들과 기성세대는 착하다고 칭찬할 뿐, 정작 기후위기 대응책을 세우는 일에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활동을 착한 사람의 선한 행동으로 보게 되면 칭찬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수많은 평범한 ‘나’들의 목소리와 몸부림으로 보면, 정책 수립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된다. 비로소 사회적 가치 의제가 정치 의제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을 착하게만 봐서는 안되는 이유다.
(중략...)
댓글
